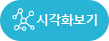| 항목 ID | GC09001387 |
|---|---|
| 한자 | 王神 |
| 영어공식명칭 | Wangsin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은 조상을 가신으로서 단지에 모셔 두는 신격.
[개설]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집안에 발생한 환자에게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경우 영신[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 굿을 할 날짜를 잡는다. 영신이 굿을 하는 도중에 집안 조상 중 비운의 죽음을 맞은 이가 있어 이를 집안의 가신(家神)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면 급한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 이때 가신으로 모시는 조상을 단지에 모셨으니, 이 신격을 ‘왕신’이라 하고 모시는 단지를 ‘왕신단지’라 한다. 부여 지역에서는 왕신을 모시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대개는 왕신단지 모시기를 꺼렸으며, 환자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모셨다고 한다.
[특징]
해마다 왕신단지 안의 쌀은 처음 수확한 것으로 갈아야 탈이 없다. 만일 집 밖에서 음식을 가져왔거나, 집 안에서 별식(別食)을 만들거나, 식구가 돈을 벌어왔거나, 곡물을 수확하였다면 우선 왕신단지 앞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왕신의 성격이 다른 가신과 달리 까탈스럽기에 반드시 먼저 위하며, 왕신 이외의 다른 가신을 모시지 않아야 한다. 성격이 유별난 사람을 보면 “네가 왕신단지냐!”라고 하는데, 이는 모시기 까탈스러운 왕신단지를 빗댄 말이다.
왕신단지를 없애려면 단지를 모시던 할머니가 죽은 후 상여가 나갈 때에 상여 뒤에 내던져 깨뜨리거나, 시집온 새 신부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왕신단지를 문밖으로 내던져 깨뜨린다. 대를 이어 왕신을 모셔야 하는 새 신부가 깨뜨림으로써 중단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여 모든 신앙 행위를 끝낼 수 있었다. 불운한 죽음을 맞이한 신령인 왕신으로 모심으로써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원령(怨靈)인 왕신은 집안의 평안이 아니라 원령을 달래는 것을 중시하였으므로 가신으로 모셔지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례 및 현황]
과거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괴목정마을과 은산면 장벌리의 몇몇 집안에서 왕신단지를 모셨다. 괴목정마을에서는 방 안의 손 없는 방위에 시렁을 만들고 시렁 위에 조그마한 오지항아리에 처음 수확하여 찐 쌀을 담아서 왕신의 신체로 삼았다. 장벌리에서는 장독에 세 갈래 나뭇가지를 놓고 나뭇가지 위에 쌀이나 맑은 물을 담은 단지를 올린 형태로 모셨다. 현재는 부여 지역에서 왕신을 모시는 곳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강성복, 『장벌리 탑제와 동화제』(부여문화원, 2001)
-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 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부여군청(https://www.buyeo.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