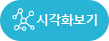| 항목 ID | GC06801425 |
|---|---|
| 이칭/별칭 | 마당밟이,뜰밟기,답정(踏庭)굿 |
| 분야 | 구비전승·언어·문학/구비전승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집필자 | 박다원 |
| 채록 시기/일시 | 2009년 3월 1일 - 「지신밟기소리」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4번지 이철우[남, 78세]로부터 임재해 등이 채록 |
|---|---|
| 채록 시기/일시 | 2009년 7월 30일 - 「지신밟기소리」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1리 332-1번지 김시중[남, 72세]으로부터 임재해 등이 채록 |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14년 - 「지신밟기소리」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7-20 경상북도 청송군’ 수록 |
| 채록지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4
|
| 채록지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1리 332-1
|
| 가창권역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
| 성격 | 민요 |
| 기능 구분 | 의식요 |
| 형식 구분 | 선후창 방식 |
| 가창자/시연자 | 이철우|김시중 |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음력 1월에 지신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
「지신밟기소리」는 청송군 안덕면과 진보면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로 의식요에 해당한다. 정원달에 지신을 밟아 액운을 물리치고 무사안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2009년 3월 1일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54번지 이철우[남, 78세], 2009년 7월 30일 청송군 안덕면 명당1리 332-1번지 김시중[남, 72세]으로부터 임재해 등이 채록하였다. 또한 「지신밟기소리」는 2014년 12월 28일 간행한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7-20 경상북도 청송군’에 수록되어 있다.
「지신밟기소리」는 사설을 많이 아는 이가 선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후렴을 부르는 선후창의 가창 방식을 가진다.
어리 지신아 눌리세 / 어리 지신아 눌리세 / 어리 지신아 눌리세 / 어리 지신아 눌리세 / 와가 백 칸을 지을 적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일월산 나리 터전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석보 제일의 집터 위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좌향 놓고 안배 놀제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임자계축 간이간묘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곤신정유 신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득수 득좌 어떻든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대국법 법을 보니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대과할일 수두룩하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천하 제일에 집터 위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행으로 주초를 박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인의예지에 기둥을 세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팔조목에 고루를 얹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삼강령에 대강을 얹어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안채에는 목숨 수자여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랑채는 복복 자라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행랑채는 창성 창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수복창령에 집을 세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천년 기와에 만년 우리라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집 지은 대목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어느 대목에 지었는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얏 이자 이대목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방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방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안방구석도 네 구석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상방구석도 네 구석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정지구석도 네 구석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집 성주님 들어보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집 조왕님 들어보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집 삼신님 들어보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만 잡신은 물알로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만 축복은 이집으로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들어오고 들어오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주인 주인 들어보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입춘하니 대길이요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개문하니 만복래라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소지하니 황금출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집 짓고 입택하여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아들형제 딸형제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수복 받고 잘 사이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부모님은 천년수 하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아들손자 만년수 하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방 팔방 돌아가며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구석 구석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소구리 명당에 집을 지어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아들이 나면 효자가 나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며늘이 나면 효부가 나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딸이 나면 열녀가 나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소가 나면 황소가 나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개가 나면 청삽살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닭이 나면 황개 장닭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말이 나면 용마로다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어떤 명당을 골랐는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고이공지에 명당터 안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신당터 안에 집터를 골라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그 집 명당에 나린 터전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나리명단에 □□터전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자손봉이가 비쳤으니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자손 번성도 하려니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노적봉이가 비쳤으니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거부장사도 날자리요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모에다 풍경을 달아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동남풍이 불어오니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핑경 소리가 요란하다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집 주인양반 들어보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먼데 출입을 하시거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먼데 살로 막아주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관청 출입을 하시거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관청살로 막아주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들에 나려 용왕살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집에 들면 집안살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산에 올라 산신살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막아주고 막아주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밟아주고 밟아주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눌려주고 눌려주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방구석을 밟아주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마당구석도 밟아주소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정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월 무방수 막아주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이월달에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삼월삼진에 막아주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삼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월 초파일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사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월단오에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오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유월 유두에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유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칠월칠석에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칠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팔월보름에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팔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구월중구에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구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시월상달에 막아내고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시월이라 드는 살은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동지섣달에 막아내자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 지신아 지신아 눌리세
대개 지신밟기는 정월달에 행해진다. 마을의 농악대[풍물꾼]들이 각 집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풍물꾼들이 없는 이웃 마을의 여유 있는 집에 가서 한바탕 지신을 밟아 주는 놀이를 한다. 그때 그 집에서는 그들에게 쌀이나 돈을 상에 차려 놓고 대접을 한다. 풍물꾼들은 상을 차려 놓은 주변을 돌거나 각 장소를 돌아다니며 지신을 밟는다.
농경을 위주로 하던 과거에는 정월에 지신을 밟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민속 의식 중 하나였다. 그때 「지신밟기소리」는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농경문화가 점차 기계화되면서 이러한 의식도 사라지는 추세이다. 「지신밟기소리」 또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의 노래인 민요가 노동 방식의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송군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신밟기소리」는 문화의 보존이란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가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청송군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민속대관』6-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임재해 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7-20 경상북도 청송군(역락,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