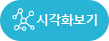| 항목 ID | GC00902764 |
|---|---|
| 영어음역 | Mosimgi Norae |
| 영어의미역 | Song of Rice Planting |
| 이칭/별칭 | 「모내기 소리」,「이앙가(移秧歌)」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작품/민요와 무가 |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
| 집필자 | 함영희 |
| 성격 | 민요|농업노동요 |
|---|---|
| 기능구분 | 농업노동요 |
| 형식구분 | 메기고 받는 선후창 |
| 가창자/시연자 | 황영수[기흥구 공세동] |
[정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서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농업노동요.
[개설]
「모심기 노래」는 지역에 따라 「모내기 소리」, 또는 「이앙가(移秧歌)」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농업노동요이다. 용인 지역에서 불리는 「모심기 노래」의 경우 마을마다 모를 심는 작업 과정이나 시각에 따라 사설이나 형식·창법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채록/수집상황]
1971년 5월에 기흥면 공세리(현 기흥구 공세동)에 사는 황영수(남, 49)가 부른 것을 채록하여, 1983년에 출간한 『내고장 민요』에 수록하였다.
[구성 및 형식]
원래 모를 심는 노동 자체는 율동적이거나 동작이 빠르지 않다. 이 때문인지 기흥구 공세동에서 채록된 「모심기 노래」는 일정한 장단이 없고 불규칙적이다. 선소리꾼이 사설을 메기면 매구마다 “얼러리 상사디야”로 후렴을 받는데, 전형적인 메나리조 형식의 4도 위에 단3도를 쌓은 음형이다.
[내용]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양석자리로 꼬자나 주게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간만 고르게 꼬자나 주게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얼핏설핏 꼬자나 주게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황새촉새 성큼실적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일락서산에 해너머 간다
얼러리 상사디야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질척벌척 꼬자나 주게
- 홍순석 편, 『내 고장 민요』(용인향토문화연구회, 1983)
- 이소라, 『경기논맴소리자료총서』3(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