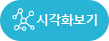| 항목 ID | GC09001431 |
|---|---|
| 한자 | 口碑 傳承 |
| 영어공식명칭 | Oral Heritages|Gubi Jeonseung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이광호 |
[정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 말로 이어져 계승되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
[개설]
구비 전승의 사전적인 의미만을 살피면, 문자가 없거나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말로 이어져 계승되는 일을 나타낸다. 구비 전승이 말로 이어져 계승된다는 특성을 띠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구비 전승은 ‘구비문학’ 혹은 ‘구전문학’과 같은 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결과물 위주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기타 민속 등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부여군의 설화, 민요, 무가 등을 중심으로 부여 지역의 구비 전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설]
부여 지역의 전설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구비 전승의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 지역 일대에서 전하여 오는 전설들은 백제사, 또는 백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러한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백제 유민으로서의 의식이 잔존하여 있으므로 구비 전승의 과정 중에서 이에 대한 반영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부여 지역의 전설은 설명 대상에 따라 크게 지명전설과 인물전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명전설은 부여의 지역 명칭과 관련하여 전하는 전설로, 대체로 지역 내 증거물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전설의 유형을 말한다. 이때 지역 내 증거물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부여 지역의 지명전설에 대한 예시로는 「홍산 시장에서 벌어진 항일시위」, 「삼괴정의 세 장수」, 「이경여와 대재각 정자」, 「천등산 다섯 장수」, 「표뜸과 계백 장군」, 「구린내전설」, 「천방사 전설」, 「희어대 전설」, 「낙화암 전설」, 「농바위」, 「삼강연 전설」, 「쌀바위 전설」, 「비홍산의 기러기」, 「조룡대」, 「천정대와 임금 바위 신하 바위」, 「갓개나루와 뱃노래」, 「파진산 이야기」, 「구룡면 용못 이야기」, 「아홉사리 고개의 산삼」, 「남매바위」, 「큰 은단지골 작은 은단지골」, 「구정봉과 꽃바위」, 「아미산 이야기」, 「구름샘」, 「혈순당의 벽화」, 「보광사 이야기」, 「책바위」, 「고니 넝굴」, 「대조사와 미륵불」, 「군장동」, 「포룡정 이야기」, 「말티의 유래」, 「망신산의 말무덤」, 「맹괭이 방죽」, 「무제산에서 난 아기」, 「문단바위」, 「금강사지의 신털이봉」, 「부산 이야기」, 「석련지와 백제탑」, 「팥죽 거리」, 「홍산 도읍에 얽힌 전설」, 「옥녀봉」, 「망심산 유래」, 「통샘 이야기」, 「지네와 두 이무기」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명 유래담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발생 목적을 고려하면 설명적 전설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물전설은 부여에서 활동을 하였거나 출생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의 생애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인 것이다. 물론 부여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부여 주민들에 의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인물전설의 예를 들면 「전우치 이야기」, 「이몽학의 오누이 힘 내기」, 「이몽학의 홍수 난 물 건너기」, 「호랑이가 된 황팔도」, 「홍산 순씨가 멸족한 내력」, 「계백 장군 이야기」, 「부여 남원 윤씨 이야기」, 「부여 효자 정씨비 이야기」, 「상진 이야기」, 「성흥산성과 7왕자」, 「유금필 장군 이야기」 등이 있다. 1982년 출간된 『구비문학대계』와 1995년에 출간된 『부여의 구비설화』는 유금필, 상진, 이몽학, 황팔도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채록하여 부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전설로서 소개하고 있다.
[민담]
부여 지역에는 「고시레의 유래」, 「과객 제사상 차려주고 얻은 삼정승」, 「곽배기 점장이와 며느리」, 「범인 황백삼」, 「재치있는 여인의 도움을 받은 관송사」, 「착한 조판서 도운 산신령」, 「칼 뽑은 열녀」 등 다양한 민담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주제에 따라 민담을 분류하면 효행담, 열녀담, 보은담, 풍수담, 변신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민담은 대체로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러한 민담을 통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는 민담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부여 지역 민담에서 나타나는 내용 요소가 주로 삶의 지혜, 유교 덕목에 대한 강조, 풍수지리적 요소 등이라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민요와 무가]
민요나 무가의 경우 부여의 생활 민속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한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요나 무가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사상과 정서가 공통적으로는 담겨 있으니, 노동의 즐거움, 노동의 지시, 처지나 신세의 한탄, 구복(求福)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여타의 구비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요와 무가에도 과거 ‘백제’라는 국가의 유민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부여 지역만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부여 지역의 민요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산유화가」나 「부여용정리상여소리」를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래질 노래」, 「베틀가」, 「상여소리」, 「꼬대각시」, 「한탄가」 등이 전해지고 있다. 부여의 무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은산별신제의 「상당굿 사설」이 있으며, 「육갑해원」이나 「안국축원」도 전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구비 전승은 해당 지역을 둘러싼 지리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승 양상에 다양한 변화를 나타낸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구비 전승의 결과물에 역사적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들이 반영된 구비 전승은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명맥이 끊겨 가고 있다. 백제의 고도라는 부여의 역사적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부여의 구비 전승에 대한 발굴과 보존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4-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김균태·강현모, 『부여의 구비 설화』(보경문화사, 1995)
- 『부여군지』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 『비홍산의 품 자락』 (부여군, 2008)
- 황인덕, 『부여 백제전설 연구』(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비문학(口碑文學)